![[데스크칼럼]동맹관계 이간질로 나라 흔드는 ‘진짜 간첩들’](https://img.ledesk.co.kr/titleimg/2023/5048_file_1.jpg?20250758110258)

영국은 기밀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로 묶인 미국의 최우방국이다.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들은 수집한 각종 기밀정보를 공유하면서 끈끈한 우정을 과시 중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영도 음지에서 치열한 상호 첩보전을 펼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대표적 사례가 냉전 당시 역사를 바꾼 핵(核) 스파이 사건이다.
대영제국 식민지로 시작한 미국이 독립하자 영국은 19세기 초 미영전쟁을 벌이는 등 북미대륙을 끊임없이 노렸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미‧영은 협력관계로 돌아섰으며 핵개발에서도 힘을 합쳤다.
다수의 영국인 학자들이 로스 앨러모스(Los Alamos) 등 미국 내 폐쇄도시에서 맨해튼계획(Manhattan Project)의 완수, 즉 성공적인 핵분열을 위해 미국인 학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마침내 노력은 결실을 맺어 인류 최초의 핵무기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広島)‧나가사키(長崎)에서 거대한 불기둥을 일으켰다.
미국은 핵기술이 타국, 특히 공산권에 넘어가지 않도록 1946년 맥마흔법(McMahon Act)을 통과시키고 기밀을 엄수했다. 당시 상원의원이자 원자력특별위원장이었던 B.맥마흔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핵물질‧핵기술의 해외 이전 금지가 골자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같은해 서태평양 미크로네시아 마셜제도 북부의 비키니 환초(Bikini Atoll) 등지에서 공개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공산권을 압박했다.
그런데 히로시마원폭으로부터 불과 4년 뒤인 1949년 소련이 카자흐스탄 세미팔라틴스크(Semipalatinsk)에서 첫 핵실험을 단행해 미국을 경악케 했다. 발칵 뒤집힌 미 정보당국은 즉각 기술 유출 경로를 추적했다. 마침내 독일 출신의 영국인 물리학자 클라우스 푹스(Klaus Fuchs‧1911~1988) 등을 용의자로 지목하고서 법정에 세웠다.
수사 과정에서 영국도 미국에 적극 협력했다.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푹스는 재판 끝에 기밀준수 서약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으며 영국 국적이 박탈됐다. 미‧영은 방첩에서도 끈끈한 관계를 과시했다. 하지만 푹스 검거로부터 약 60년 뒤 놀라운 비사(祕事)가 드러났다. 푹스가 소련뿐만 아니라 ‘영국’에게도 핵기술을 몰래 넘긴 정황이 기밀 해제된 자료에서 확인된 것이었다.
사실 맥마흔법 대상국에는 영국도 포함돼 있었다. 미국이 조만간 핵기술을 공유할 것이라 철썩 같이 믿고 있던 영국은 이러한 ‘핵통수’에 대로(大怒)했다. 영국은 맥마흔법 통과 당해에 자체 핵개발에 착수했으며 먼저 맨해튼계획에 참여한 자국 학자들부터 철수시켰다. 푹스는 귀국 과정에서 핵탄두 설계도 등을 은밀히 챙겼으며 이를 영국 정보기관에 전달했다.
2017년 ‘세계를 바꾼 스파이 : 클라우스 푹스, 물리학자이자 이중스파이’를 출간한 영국의 군사저술가 마이크 로시터(Mike Rossiter) 등에 의하면 이러한 미‧영의 비사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독일‧러시아 기밀문서에서도 확인됐다고 한다. 즉, 미국도 이미 푹스 수사과정에서 그가 영국에 핵기술을 넘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이는 푹스가 석연찮은 이유로 스파이가 아닌 기밀준수 위반으로 처벌받은 점이 뒷받침한다. 당시 시대상 미국이 푹스를 간첩으로 규정할 경우 “영국은 동맹국이 아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볼썽사납게 대립한 미‧영이었지만 물밑에서만 고성 지르며 기싸움을 벌였을 뿐 대외적으로는 손을 맞잡고 여전히 강력한 동맹관계를 과시했다. 소련‧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병역자원과 자유‧민주에 대한 증오와 핵무기로 무장한 주적(主敵)세력이 존재하는 한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근래 미국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일부 야당은 반미(反美)를 선동하는 듯한 태도로 정부 책임으로 몰아가는 반면 대통령실은 사실여부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야당은 해당 의혹 진위여부 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을 관과하고 있다. 미‧영의 사례처럼 첩보전은 우방국 사이에서도 늘상 있어왔다는 점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한국의 입장만 달랐을 뿐이다. 일례로 1996년에는 한국에 각종 미 해군 정보를 보내오던 재미교포 로버트 김(한국명 김채곤)이 미 연방수사국(FBI)에 적발된 적 있다. 당시 미국으로서는 충분히 노발대발할 일이었지만 한국에 별다른 큰 공식항의 없이 유야무야 넘어갔다.
도청 의혹보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정쟁화하고 나아가 동맹을 이간질하려 하는 듯한 태도의 일부 세력이다. 이들 세력은 불법 대북송금 연루 의혹에 휩싸였지만 사과 등에서 일언반구(一言半句)조차 없다. 전국 도처에서 존재가 드러나는 각종 간첩단에 대해서도 함구 중이다.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ctrine) 대신 동방정책(Ostpolitik)을 추진한 서독의 4대 총리 빌리 브란트(Willy Brandt‧1913~1992)는 새 시대의 아이콘 같은 인물이었다. 동방정책은 동독‧소련 등과의 관계 개선이 골자다. 그는 총리가 되기 전에는 서독의 탈(脫) 미국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브란트의 비서 귄터 기욤(Günter Guillaume)이 동독 스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서독인들에게 충격을 던졌다. 이들은 서독의 각종 정보를 동독에 유출하는 한편 서독을 내부에서부터 사상적으로 무장해제시키려 했다. 단순히 핵통수에 서운해 하고 정상회담 질문지 등을 궁금해 하는 우방국 스파이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악랄한 게 나라를 송두리째 갉아먹는 적성국 자생(自生)간첩이다.


![[데스크칼럼]한일정상회담과 실크로드 개척](https://img.ledesk.co.kr/titleimg/2023/4810_file_1.jpg)
![[데스크칼럼]경고도 한 두 번이면 족하다](https://img.ledesk.co.kr/titleimg/2023/4890_file_1.jpg)
![[데스크칼럼]정녕 또 국민을 배신하려 하나](https://img.ledesk.co.kr/titleimg/2023/4970_file_1.jpg)
![[영상] 각종 여성시설 논란 한방 정리! 외국인들 솔직 반응은?](https://img.ledesk.co.kr/titleimg/2025/13295_file_1.webp)
![[뉴스원샷] 스쿼트 1000개가 원인? 15세 소년 ‘장기 손상’ 미스테리 (with Dark room)](https://img.ledesk.co.kr/titleimg/2025/13321_file_1.webp)

![[국제숏]트럼프 곳간 전락한 일본, 수천억대 미국쌀 사고도 뭇매](https://img.ledesk.co.kr/titleimg/2025/13312_file_1.webp)


![[필사적뉴스] 한국인의 ‘짠맛’ 사랑…줄인다고 줄였는데 WHO 기준치 1.6배](https://img.ledesk.co.kr/titleimg/2025/13315_file_1.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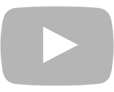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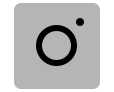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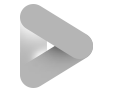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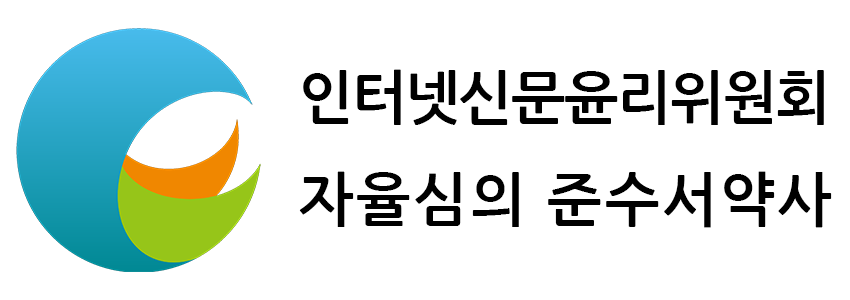
 채널
채널 로그인
로그인
댓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