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제갈공명의 추풍오장원(秋風五丈原)](https://img.ledesk.co.kr/titleimg/2023/4379_file_1.jpg?20240451145851)

“엎드려 몸을 낮추고 나라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니 이는 죽어서야 끝이 날 것입니다(鞠躬盡力 死而後已)” 삼국시대 촉한(蜀漢)의 재상 제갈량이 북벌에 앞서 천자(황제)에게 올렸다는 후출사표(後出師表)에 나오는 내용이다. “출사표를 읽고 눈물 흘리지 않으면 충신이 아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갈량은 권신 중의 권신이었음에도 대권을 노리는 대신 천하와 백성만을 위해 힘쓴 인물이었다.
제갈량은 후한(後漢) 13주(州) 중 하나인 서주 낭야국 출신이었다. 조조의 서주대학살을 피해 어려서 형주로 이주한 그는 스스로 농사짓고 주경야독하면서 자신을 알아줄 주군을 기다렸다. 이윽고 유비의 삼고초려에 발탁된 제갈량은 때로는 꾀주머니로, 때로는 행정관으로, 때로는 외교관으로, 때로는 군(軍) 지휘관으로 활약하면서 커리어를 쌓아나갔다.
400년 한나라를 무너뜨린 조위(曹魏)에 맞서 유비가 칭제(稱帝)하자 제갈량은 승상‧녹상서사‧가절‧사례교위를 겸하는 등 내‧외조를 모두 장악하고서 명실상부한 촉한의 2인자가 됐다. 제갈량의 권세가 얼마나 하늘을 찔렀냐면 소설 삼국지연의에서는 임종을 앞둔 유비가 아예 제갈량에게 나라를 떠넘기려는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연의에는 유비가 어린 아들을 불러서는 눈물 흘리며 “제갈승상을 아부(亞父‧아버지 같은 사람)로 모셔야 한다. 그래야 네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유언을 남기는 모습도 연출된다. 이에 제갈량은 바닥에 이마를 찧으며 “신이 어찌 역심을 품겠나이까. 신은 살아서 한(漢)의 신하이고 죽어서는 한의 귀신이 되겠나이다”라고 울부짖었다고 한다.
권신은 통상 언행불일치가 일반적이지만 제갈량은 달랐다. 유비가 사망한 뒤 어리석고 유약한 후주(後主) 유선이 즉위하자 고명대신이었던 제갈량은 정말로 찬탈을 꾀하는 대신 대의를 위해 분신쇄골했다.
제갈량은 400년 전 한나라 건국공신이었던 행정의 달인 소하, 책략의 달인 장량, 용병(用兵)의 달인 한신의 역할을 오로지 제 한 몸으로 감당해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평 한마디 없었던 그는 승상부에 틀어박혀 편안히 권세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역적토벌을 위해 노구(老軀)를 이끌고 수차례 험난한 북벌의 장도(壯途)에 오르기도 했다.
결국 과로가 겹쳤던 제갈량은 후출사표에서 “신의 충심은 죽어서야 끝이 날 것입니다”라고 맹세한 대로 추풍오장원(秋風五丈原)에 떨어지는 한 잎 낙엽이 되고 말았다. 천자의 이름을 팔아 몸값을 높이며 대권을 노리는 대신 오로지 대의에만 충실했던 제갈량의 일생은 당대는 물론 후대에도 의사(義士)의 모범이 돼 깨끗한 이름을 길이길이 남겼다. 훗날 천고일제(千古一帝) 강희제가 그를 자신과 동급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나는 (제갈량처럼) 하늘을 섬기는 신하”라고 천명함으로써 제갈량은 도리어 지존(至尊)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제갈량보다 한세대 앞선 인물인 이각‧곽사는 전혀 다른 인물들이었다. 역적 동탁을 따라 머나먼 서쪽 양주에서 옮겨와 조정에 입관(入官)한 뒤 갖은 악행을 일삼았던 이들은 동탁 사후 권좌를 차지하고서 대권을 위해 천자를 농락했다. 이러한 행태는 한나라 붕괴의 결정적 사건이 된 삼보(三輔)의 난에서 절정에 달했다.
동탁이 사망하자 군사를 몰아 여포를 격퇴하고 장안성을 점령한 이각‧곽사는 당초 협력관계였다. 후한 마지막 황제인 헌제를 겁박해 대사마‧대장군 등의 벼슬을 하사받고 권신이 된 이들은 오로지 권력‧살인‧재물‧주색에만 충실했다. 이렇듯 악행으로 상부상조하던 두 인간이었지만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는 법, 어느 순간부터 옥좌를 노리기 시작한 이각‧곽사는 서로에게 칼날을 겨눈 채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이각‧곽사는 저마다 헌각(헌제‧이각)연대 또는 헌곽(헌제‧곽사)연대를 주장하거나 상대를 헌핵관(헌제의 핵심관계자이자 간신)이라 비방하면서 황제를 철저히 이용해먹었다. 개전 직후 조카를 보내 천자를 호위(라 쓰고 납치라 읽는다)한 이각은 간발의 차이로 납치에 실패한 곽사가 “역적놈” “간신”이라고 핏대를 세우자 “난 이렇게 천자를 모시고 있는 충신이다. 누가 누구더러 역적이라 하느냐”며 이죽거렸다고 한다.
헌제를 향한 거짓충성의 최종목표는 대권이었다. 황제의 충신을 자처하고 조정의 2인자로 군림한 뒤 명분‧실리를 모두 취함으로써 백관들을 심복으로 만들어 종래에는 황위를 선양(禪讓)받으려는 속셈이었다. 실제로 이각‧곽사의 상전으로서 상국(相國) 벼슬을 지내면서 천자의 이름을 빌어 대규모 숙청과 같은 인사권을 과시했던 동탁은 주변 백관들이 아첨하느라고 즉위를 권하자 즉각 침을 흘렸다고 한다.
근래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각‧곽사‧동탁과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오로지 제 대권만을 위해 전당대회에서 당심(黨心)을 얻겠다며 정책‧비전은 없이 OO연대나 핵관 등 조어(造語)를 만들어 무차별 남용하고 있다. 그 사이 이를 바라보는 민심은 나날이 싸늘해져 차기 총선‧대선 결과는 불투명해지고 있다. 당심도 마냥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천하만민을 위해 황제를 보필하며 북벌에 나섰던 제갈량과 달리 정책도, 비전도 없이 오로지 옥좌만을 위해 ‘황제팔이’에 혈안이 됐던 이각‧곽사‧동탁의 말로는 비참했다. 동탁은 민심‧당심이 떠나간 끝에 다른 사람도 아닌 최측근 여포의 한 창에 꿰뚫려 목숨을 잃었다. 이각‧곽사도 천자로부터 역적으로 지목되고 황제팔이의 약효가 다하자 수하들이 뿔뿔이 흩어져 제후‧측근에게 도륙됐다.
대의를 잊은 사욕은 필히 재앙을 야기한다. 권력에만 눈이 먼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출사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각‧곽사‧동탁의 좁은 길이 아닌 제갈량의 큰 길을 걷길 바란다. 그 속에 민심‧당심이 있고 대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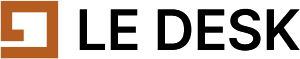

![[뉴스숏]“역시 캡틴” 4월 스포츠스타 브랜드평판 1위 손흥민](https://img.ledesk.co.kr/titleimg/2024/9013_file_1.webp)
![[뉴스숏]이태원 외국인이 준 초콜릿에 주사 구멍이 난 이유는?](https://img.ledesk.co.kr/titleimg/2024/9014_file_1.webp)
![[뉴스숏]“7000원 내세요” 세계 최초 입장료 받는 유럽여행 성지](https://img.ledesk.co.kr/titleimg/2024/9016_file_1.webp)
![[뉴스숏]“이런 방법도 있어요” 뉴진스 사태의 충격적 진실](https://img.ledesk.co.kr/titleimg/2024/9015_file_1.webp)
![[뉴스숏]“뻔뻔함의 극치” 클린스만 한국 축구 흔들기에 축구팬 공분](https://img.ledesk.co.kr/titleimg/2024/9001_file_1.webp)



![[뉴스숏]한 자영업자의 출산휴가 사연에 여성들이 분노한 이유는?](https://img.ledesk.co.kr/titleimg/2024/9002_file_1.webp)
![[뉴스숏]전 아이돌 멤버 공무원 저격 사연에 ‘찬반양론’ 점화](https://img.ledesk.co.kr/titleimg/2024/9003_file_1.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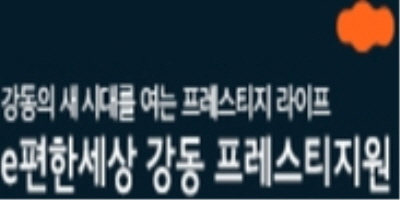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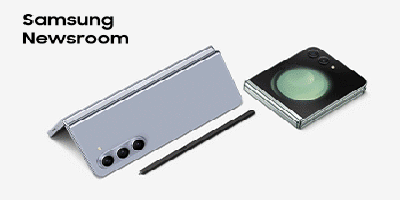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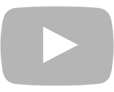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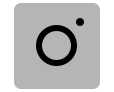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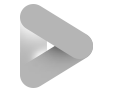

 채널
채널 로그인
로그인
댓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